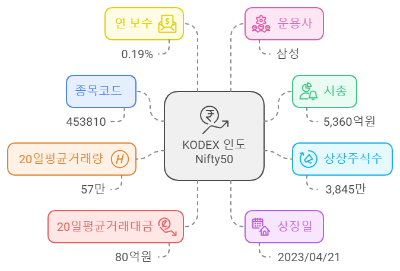1. 중상주의(Mercantilism)란 무엇인가? (유럽의 탐욕)
중상주의는 16~18세기 유럽에서 지배적이었던 경제사상으로, “국가의 부는 금과 은의 양으로 결정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 결과:
- 식민지 개척 → 약탈 → 금·은 쌓기
- 무역에서 흑자만 추구 → 관세 강화, 수출만 장려, 수입 억제
- 생산성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약탈에 의존 → 산업혁명 직전까지 경제정체
하지만 이 사고는 심각하게 잘못된 전략이었다.
- 금·은은 가치 저장 수단이지 생산성의 원천이 아님.
- 약탈과 독점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
-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고 결국 혁신 경쟁에서 뒤처짐.
즉, “돈을 쌓아두는 것이 부”라는 사고는 경제성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다.
2. 대한민국의 현대판 중상주의: 부동산
이제 한국으로 오면,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
“부는 부동산에서 나온다.”
이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나?
- 정책: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 정책 설계는 부동산 방어 중심. 전 세계 유일한 제도인 전세제도 시행.
-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임.
- 기업: 혁신 산업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 선호.
- 청년: 창업보다 “내 집 마련”이 인생 목표.
-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 → 금융위기 리스크 상시 존재.
즉, 돈이 부동산이라는 사금고에 갇혀버려 자본이 선순환하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
18세기 유럽의 중상주의 유령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는 것이다.

3. 유럽 vs 한국 기득권: 탐욕의 방식 비교
여기서 중요한 차이:
- 유럽 기득권: 조직적으로 식민지를 개척, 자원 약탈 → 금·은 축적.
- 한국 기득권: 뭔가를 개척하고 창조할 능력도 없으니 자국민을 대상으로 착취.
-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세금과 이익을 독점.
- 정책과 법을 설계해 부동산만이 부의 사다리가 되도록 만듦.
- 결과적으로 청년층·서민층을 경제적 노예화.
즉, 유럽은 최소한 ‘전쟁’이라는 대규모 행동을 했지만,
한국 기득권은 자국민을 식민지처럼 다루며 제도적 착취를 정교하게 실행했다.
4.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돈이 안 돈다”
- 생산성 없는 자산에 자본이 고정 → 기업 투자, 스타트업, 연구개발에 자본이 안 흘러감.
- 소비 여력 축소 → 가계가 집값, 대출 이자 갚느라 허덕 → 내수 침체.
- 청년의 모험심·창의성 감소 → “집부터”가 인생 목표가 되면서 혁신적 리스크 테이킹 포기.
- 정책 왜곡 → 정부는 집값 방어, 세수 확보를 위해 규제·세제 설계를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듦.
-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붕괴.
결국, 한국 경제는 부동산이라는 금고에 갇혀 질식하고 있다. 혼인률, 출산률이 박살 난 것도 이러한 결과 아닐까?
결론
중상주의가 금·은에 집착해 유럽 경제를 수백 년간 묶어두었다면, 한국은 부동산이라는 현대판 금·은에 집착해 경제의 피를 말리고 있다.
혁신과 생산성이 아닌, ‘가격 상승’이라는 착시 부’에 의존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몰락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자본의 흐름”을 혁신과 산업으로 돌려야 하는데 과연 될까?